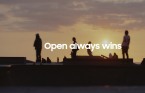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주말 개최된 뉴욕 국제자동차쇼에서는 각 업체들이 새로운 SUV를 선보였다. 고급차 브랜드인 캐딜락이나 링컨을 비롯해, 도요타자동차는 주력 SUV 'RAV4'를 어필했으며, 예전에는 특별 취급 받아왔던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의 마세라티 부문까지도 새로운 SUV의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캐딜락 부문 책임자 요한 드 나이슨(Johan de Nysschen)은 최근 캐딜락이 투입하는 신형 SUV 'XT4'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이 분야에 매력적인 신차와 함께 비집고 들어가려 하고 있어, 승자와 패자가 나올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UV 시장에 대해 "왕성한 수요가 있고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며, 그 속에서 "우리는 물론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컨설팅 회사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3년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SUV와 크로스 오버 차량의 표준 모델과 고급 모델이 모두 90개 종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은 각각 65개 종류와 53개 종류를 기록했다. 최근 럭셔리 자동차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VW), 아우디는 미국 현지 SUV 공장에 대한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있어 LMC의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LMC는 신차 투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SUV 등의 판매 대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 몇 년 내에는 연식이 비교적 새로운 SUV가 리스 계약이 해제되면서 중고 시장에 투입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신형 차량들과의 판매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블루북(KBB) 칼 브라우어 애널리스트 또한 "리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시장에 SUV가 늘어남에 따라 신차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차종이 늘어나면 각각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이치로, 이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다"며 "많은 차종이 모두 팔린다는 것은 무리이고, 어느 업체든 점유율을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BB에 따르면, SUV 1대당 평균 가격은 2017년 3만5991달러(약 3826만원)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든 통계 수치들이 일제히 자동차 업계에 대해 "3년 전과 같은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브라우어는 덧붙였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